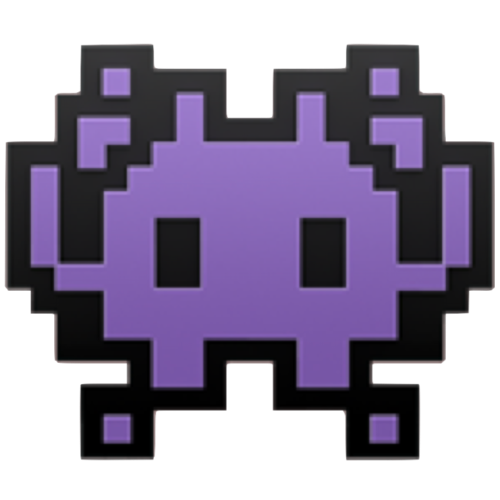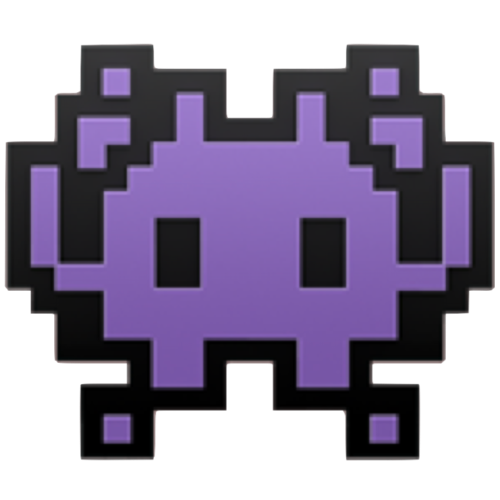기계와 함께 사고하기, 혹은 인간으로 남는 일에 대하여
기계와 함께 사고하기, 혹은 인간으로 남는 일에 대하여
|
|
|
AI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 〈아틀란틱〉에 실린, 콰메 앤서니 애피아의 칼럼 '탈숙련의 시대(The Age of De-Skilling)'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그는 인간이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상실이 반드시 퇴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 때마다, 그 도구 역시 우리를 만든다. 이것은 공진화(co-evolution)에 관한 이야기다.
소크라테스는 글쓰기가 인간의 기억을 무디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말이 기록된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기술은 언제나 어떤 능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고의 형식을 연다. 애피아는 이 오래된 순환을 “잃음과 획득의 리듬”으로 본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분석이 생겼다. 손의 감각은 줄었지만, 추상의 능력은 커졌다. AI 역시 이 오래된 리듬의 최신 버전일 뿐이다.
문제는 단순히 능력이 줄거나 느는 문제가 아니다. 기술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느끼는 방식, 즉 정체성(identity)의 구조를 바꾼다. 쇼샤나 주보프가 관찰한 1980년대 펄프공장의 노동자처럼, 또는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처럼 기계가 대신 일하는 순간 , 사람은 “내가 고삐를 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한다. 효율은 높아졌지만, 의미는 줄어든다. AI 시대의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맞닥뜨리고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 ‘잘 작동하는 나’로 존재하는 대신,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를 스스로 묻는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
애피아가 흥미로운 점은, 탈숙련을 단순히 ‘기술의 쇠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숙련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코드를 직접 짜던 프로그래머는 이제 AI가 쓴 코드를 검토하고 수정한다. 의사는 AI가 제시한 진단을 해석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로 옮겨간다. 숙련의 무게중심이 ‘생산’에서 ‘판단’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성이다. 기계가 문제를 푼다면, 인간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하는 존재로 남는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덕목을 애피아는 ‘통제(control)’가 아니라 관리(stewardship)라고 부른다. 관리는 기술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사유하는 법이다. AI는 확률적으로 사고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구분한다. 기계는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인간은 방향을 선택한다. 이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시자이자 조율자로서의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하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가설로 의심하고 실험하는 태도. 이게 바로 ‘관리의 기술’이다.
결국 애피아의 핵심 문제의식은 “AI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AI와 함께 사고하는 동안, 우리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이다. 그가 말하는 ‘구성적 탈숙련(constitutive de-skilling)’은, 기계가 인간의 도구적 능력뿐 아니라 판단, 상상력, 공감, 의미감각 같은 근본적 자질을 약화시킬 위험을 뜻한다. 그 위험은 격렬하게 오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조용히 스며든다. 언어가 평평해지고, 문장이 매끄러워지고, 모호함이 불편해진다. 이해보다 유창함을 선호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기계의 기계’로 변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는다. 기술의 진보는 늘 상실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문맹이 문해로, 장인이 엔지니어로, 기억이 기록으로 옮겨온 것처럼 지금의 변화 역시 재숙련(reskilling)의 과정일 수 있다. AI는 인간의 손을 빼앗지만, 대신 감독과 의미 판단의 영역을 우리에게 남긴다. AI가 사고를 대신한다면, 우리는 사고의 방향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애피아가 말하는 ‘관리(stewardship)’를 하나의 윤리적 태도로 읽었다. 관리란 통제보다 섬세하고, 책임보다 느리며, “지켜보는 힘”과 “유지하는 기술”의 조합이다. 기계가 학습하는 동안, 우리도 배워야 한다. 어떤 판단을 위임하고, 어떤 감각을 지켜야 하는지를. 기술을 멈출 수는 없지만,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
애피아는 말한다.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기술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 나는 이 문장을 ‘사유의 자율성’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AI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어떤 말이 진짜 내 말인지, 어떤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지 분별하는 일. 그건 철학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마지막 인간의 기술이다.
결국 이 글은 기술의 미래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유지(self-maintenance)에 대한 것이다. 기계와의 공진화 속에서 인간은 계속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가”를 묻는 일만큼은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다. 그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탈숙련의 시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숙련이다.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거부할 수 있을까? 혹은 많은 이들의 바램 섞인 예측처럼, AI는 자멸할 것인가?
•≋•
|
|
|
👾 서울외계인은 여러분의 유료 구독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
|
© 2025 👾 서울외계인hello@seoulalien.com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수신거부 | 구독정보변경 |
|
|
|
|